별다른 특이함 없이 평범할 정도로 무난하게 시작되는 “오후 네시”라는 소설은
오후 네시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의 등장과 함께 이전과는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로 전환된다.
무례한 사람으로 취급되던 불청객의 존재는 결국
주인공인 “에밀”이 평생을 간직해왔던 관념과 예의, 선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아니 지식과 가치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완벽하지 않고 무지하다는 것을 인식한 순간,
“에밀”은 “베르나르댕”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에게도 자유를 부여한다.
사람은 스스로가 어떤 인물인지 알지 못한다.
자기 자신에게 익숙해진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이다.
세월이 갈수록 인간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인물을 점점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낯설게 느껴진다고 한들 무슨 불편이 있을 것인가? 그 편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되면 혐오감에 사로잡힐 테니까.
만약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상하게 느꼈어야 할 그런 일을 나는 아직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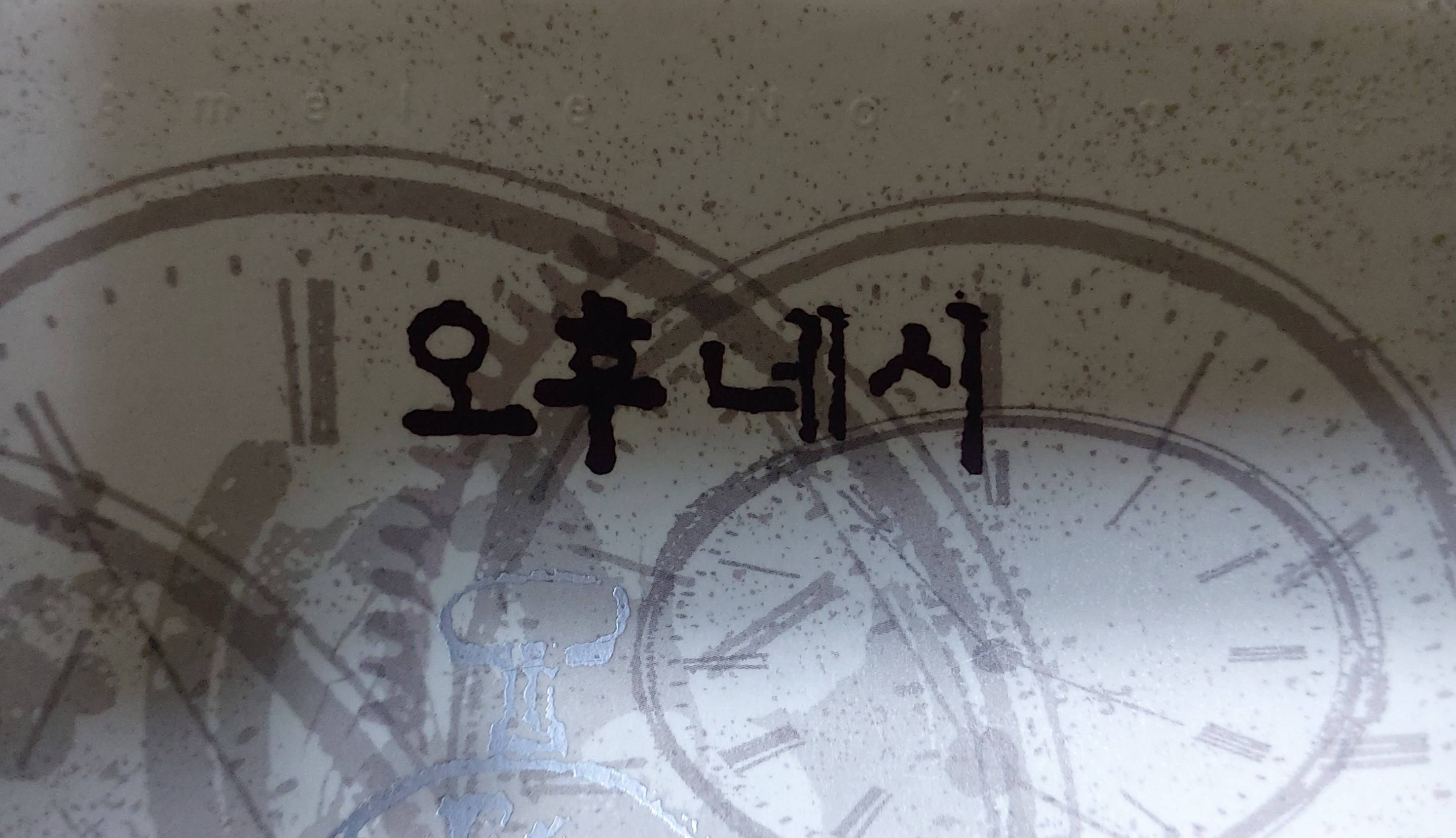
쓸모 없는 기억들만을 숱하게 만났을 뿐이다.
정신의 방어체계는 머리로는 납득이 불가능하다.
각자가 그 체계에 도움을 청하지만, 그 체계는 구체적인 도움 대신 아름다운 영상만을 불어넣어 줄 뿐이다.
그리고 결국 그 판단이 옳았다는 게 밝혀진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영상은 사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그 순간을 구원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르나르댕 씨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자신 안에 갇혀 있었다.
그의 독방에는 창문조차 없었다. 너무나도 지독한 감옥이 아닌가!
더 끔찍한 일은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늙고 멍청한 뚱보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가 시계에 집착하는 이유를 퍼뜩 깨달았다.
삶을 사랑하는 이들과는 반대로 팔라메드는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축복했다.
자신이 갇혀 있는 우리 속에서 유일한 빛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이었다.
따라서 그의 집 안에 있는 스물다섯 개의 시계는 느릿하고 확실한 리듬에 따라 그를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죽고 나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부재에 입회하지 않아도 되리라.
육체가 없으니 그 안에 담길 공허도 없으리라.
삶 대신에 무가 되리라.
나의 신념과 선이라는 도덕적 관점은 과연 불변의 절대적 가치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양과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
자신이 세워놓은 선과 지식의 틀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면 그 틀을 갖추기 위한 평생의 노력은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
나의 흰색은 녹아 버렸고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두 달 전 여기 앉아 있었을 때,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었다.
아무런 삶의 흔적도 남기지 않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가르쳐 온 일개 교사라는 것을 지금 나는 눈을 바라본다.
눈 역시 흔적을 남기지 않고 녹으리라.
하지만 이제 나는 눈이 규정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다.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더 이상 알지 못한다.

'어쩌다 접하게 된 >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년세세 - 황정은 (0) | 2021.05.14 |
|---|---|
|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 존 르카레 (0) | 2021.05.09 |
| 가슴뼈 하나 빼내듯 떠나보낸 사랑 - 양소연 (0) | 2021.04.09 |
| 일인칭 단수 - 무라카미 하루키 (0) | 2021.03.30 |
| 공간이 만든 공간 - 유현준 (0) | 2021.03.21 |



